티스토리 뷰
목차
시작은 미미하지만, 끝은 창대하리라.
“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…”
— 『훈민정음 서문』, 세종대왕
578년 전,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었다.
“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.”
세종은 다름을 부정하지 않았다.
비교하지 않았고,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,
중국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.
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,
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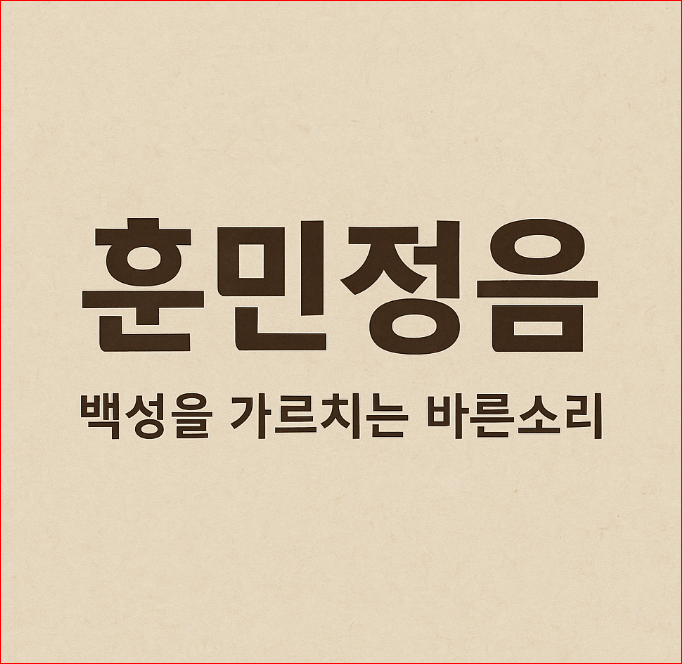
🌱 다름에서 시작된 평화
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다.
세종대왕도 그러하다 했다.
그래서 우리는 다름이 불편하다.
다름이 갈등이 되고,
다름이 분쟁이 된다.
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.
다르기에 섬세해질 수 있다.
다르기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.
그 생각의 전환이 한글을 만들었다.
그 선택이 평화에 다가가는 첫걸음이었다.
💬 말할 수 있어야, 존재할 수 있다
세종대왕은 보았다.
“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,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.”
글이 없다는 것은
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.
그저
말할 수단이 없었을 뿐이다.
그래서 세종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.
배우지 못해도, 권력이 없어도,
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.
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.
표현의 자유이며, 존재의 증거였다.
-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,
- 내 마음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으며,
-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.
그것은 곧 존엄이었다.
🪶 표현은 공감으로 이어진다
처음으로 한글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썼다.
“보고 싶다.”
“슬프다.”
“고맙다.”
그리고 그 글을 읽은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.
“나도 보고 싶다.”
“나도 슬프다.”
“나도 고맙다.”
마음이 이어졌다.
표현은 공감이 되었다.
한글은 마음을 담아주는 그릇이 되었다.
마음이 글이 되고, 글이 마음을 움직였다.
그것이 평화였다.
🌸 강요 없는 조화
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.
법으로 강제하지 않았고,
권력은 무시했지만 백성은 한글을 택했다.
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.
쉽고, 편하고,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.
억지로 같아지지 않아도
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.
이것이 진짜 평화였다.
🔥 500년의 지킴
한글은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.
499년 동안 지켜낸 문자였다.
비웃음을 받아도, 금지당해도,
감옥에서도 사전을 만들었다.
그것이 우리였다.
“이게 나야.”
그 한마디를 잃지 않기 위해
목숨을 걸었다.
평화는 선언이 아니라,
끊임없이 지켜내는 선택이다.
🌏 한글이 평화를 깨워준다
한글이 걸어온 길은 곧 평화의 길이다.
- 다름을 인정하고
-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고
- 강요 없이 어울리고
-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길
그 길 위에서
한글은 우리 안의 평화를 깨워주었다.
잊고 있던 존엄을,
묻혀 있던 마음을,
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를 일깨워주었다.
🕊 지금 이 순간의 한글
오늘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
한글로 말하고,
한글로 쓰고,
한글로 생각한다.
하지만 이 ‘당연함’은 기적이다.
한 사람의 고민이 세상을 바꾸었고,
수많은 사람의 지킴이
오늘의 평화를 만들었다.
🌸 그래서, 한글은 평화다
한글은 언어가 아니다.
한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.
그리고 평화를 깨우는 문자다.
- 누구나 배울 수 있고
- 누구나 쓸 수 있으며
-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
한글은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.
인류의 문맹을 없애고,
표현의 자유를 주며,
평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.
따라서 한글은
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독보적인 문화 자산이다.
🕊 한글. 글이 없는 모든 이의 마음의 소리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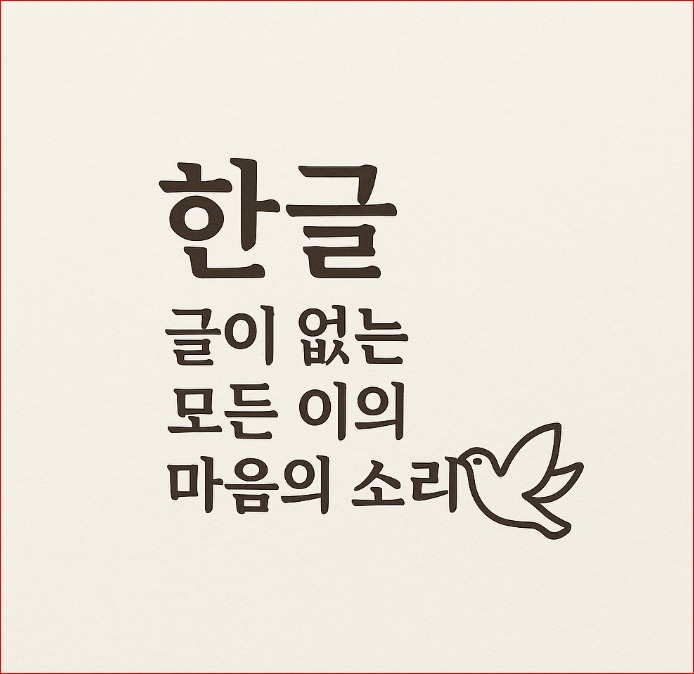
세종은 글이 없던 사람들에게
글을 건네주었다.
목소리가 없던 사람들에게
목소리를 건네주었다.
글이 없다는 것은,
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.
그저 전할 도구가 없었을 뿐.
한글은 그 마음에 길을 열어주었다.
소리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었고,
목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세상을 주었다.
🕊 한글.
글이 없는 모든 이의 마음의 소리.
✍️ 이제, 우리가 이어갈 차례다.
한글이 걸어온 길 위에서
우리는 평화를 걷고 있다.
